
길윤형 지음, 생각의힘 펴냄
“일본이 동양의 영국이라면 조선은 동양의 프랑스로!” 조선말 급진 개화파이자 희대의 풍운아인 김옥균이 한 말이다. 세계의 패권을 두고 영국과 자웅을 겨루던 프랑스처럼 조선 역시 일본에 꿀리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기를 염원한 것이다. 물론 현실은 희망과 달랐다. 일본은 조선을 프랑스가 아닌 아일랜드로 취급했고 끝내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해방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래 한국은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냉전의 최전선에 내몰려야 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사이 한국의 국력이 크게 성장했다. 드디어 김옥균의 꿈이 이뤄지는 걸까. 길윤형의 <신냉전 한일전>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 <한겨레>에서 오랜 시간 통일 문제와 한일관계를 취재해온 지은이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둘러싼 한국의 ‘뒤집기’와 일본의 ‘굳히기’가 엎치락뒤치락한 지난 4년의 역사를 샅샅이 살핀 끝에, 이 승부의 패자는 한국이라고 담담히 선언한다.
예정된 패배는 아니었다. 한국전쟁 때 흥남에서 탈출한 피란민의 아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대치 상태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을 자신의 시대 사명으로 여겼고,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일본은 이 회담의 결과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없었고, 중·단거리 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미국과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몰두한 나머지,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 등 한국과 일본 사이 중요 현안에 대한 관심을 놔버리다시피 했다는 것도 일본에는 불만이었다.
“재팬 패싱”의 결과는 참혹했다.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끝내 해소하지 못한 일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데 일조했다. ‘노딜’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국에 숨 고를 틈도 주지 않고 일본의 다음 공격이 꽂혔다.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3개 물질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전략물자 수출에서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진지하게 응하지 않는 한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었지만,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를 일본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다. 어느 때보다 ‘정치’가 요구되던 순간, 사람들을 움직인 건 100년의 원한이라는 ‘정념’이었다. 물론 그 끝은 좋지 않았지만 말이다.
‘신냉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음에도 정작 중국 얘기가 거의 없다는 건 이 책에서 흥미롭고, 또 아쉬운 지점이다. ‘북한 문제’와 ‘일본 문제’가 통합적 관점에서 다뤄진다기보다 병렬적으로 나열된 인상을 주는 것 역시, 이 책이 얘기하는 신냉전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냉전은 ‘구냉전’과 어떤 점에서 다르고, 이 새로운 질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가? 일관되게 일본을 무시하고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는데 공을 들였던 건 미국과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국 통일한국이 되기 위함이었나, 아니면 일본을 대신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되기 위함이었나? 그 점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건, 어쩌면 지은이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일지도 모르겠다.
유찬근 대학생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전문] 윤 “국정 방향은 옳아”…마이웨이 기조 못 박았다 [전문] 윤 “국정 방향은 옳아”…마이웨이 기조 못 박았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6/53_17132351200937_6517132350976343.jpg)
[전문] 윤 “국정 방향은 옳아”…마이웨이 기조 못 박았다

윤 “경제 포퓰리즘은 마약 같아”…이재명 민생지원금 겨냥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골프·비즈니스 항공·코인 금지”
왜 ‘가만히 있으라’ 했는지 엄마는 10년 지나도 답을 듣지 못했다

윤 “올바른 국정, 최선 다했지만 모자라”…총선 참패 뒤 첫 입장

휴대폰 요금 월 7만원→4만원…‘통신 호갱’ 탈출법

의협 ‘총선 결과’ 왜곡 해석에…“민심은 의대 증원” 비판

윤 대통령, 박근혜 닮아간다

이스라엘 당국자 “인명피해 없는 이란 시설 공격 검토”

이재명, 이화영 ‘검찰청 술판’ 주장에 “CCTV 확인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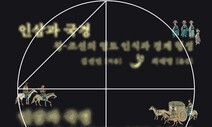













![‘제2의 청해진해운 없게’ 한발짝 겨우 딛었다[세월호 10주기] ‘제2의 청해진해운 없게’ 한발짝 겨우 딛었다[세월호 10주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3/53_17129437971656_2024041250206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