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천km도 타지 않은 차에 계분 20포대를 실었다. 지금도 이때의 흔적이 가끔 발견된다.
농달(농사의 달인, 이웃집 할머니)이 몇 주째 보이지 않았다. 포천의 봄은 “밭에 계분 할 텨?”라는 농달의 질문에서 시작돼야 한다. 설이 지나고 3월이 왔건만 농달은 아무 말이 없었고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나를, 아니 우리의 밭을 잊으신 걸까. 때 되면 아니할 수 없는 일이다, 포천의 봄은 원래 늦다 생각하면서도 내심 초조했다. 초조함도 바이러스처럼 전파되는 것일까. 어느 날 아침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재워둔 김을 굽던 장모님이 나섰다. “할머니네 이것 좀 갖다줘야겠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봄 전령이 오지 않자 김을 매개로 직접 찾아나서겠단 말이었다.
장모님은 깊은 한숨으로 농달의 와병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19를 앓고 나았지만 이후에도 거동하기가 예전 같지 않아 올해 농사를 어찌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대문 앞 의자에 볕 쬐러 나가 앉아 있기도 어려워졌다니 밭일이 문제가 아니었다. 고령의 농달이 하루빨리 쾌차하길 바랄 뿐이다.
올해 농달의 밭 개시는 누군가에게 맡겨졌다. 계분도 트랙터를 부르는 일도 농달에게 의지하기 어려워졌다. 괜찮다, 할 수 있다. 이제 2년차가 아닌가. 자립 의지를 다졌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계분 파는 가게를 본 적이 없지만, 그까짓 것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장모님은 언젠가 받아두었다며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명함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닭똥 파는 남자, 김○○’. 목소리 굵기가 남달랐던 닭똥 파는 남자는 닭똥을 팔되 100포대 이하는 배달해줄 수 없다고 했다. 우리 밭에 필요한 양은 20포대, 우리는 닭똥 100포대씩 파는 남자가 아닌 소량도 파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사실 연 매출 22조원에 달하는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앱에서도 계분을 판다. 한 포대에 8천~1만원 남짓이다. 그냥 그걸 시키려 했는데 장모님이 가격에 난색을 보였다. 지난해 농달과 함께할 때 한 포대 2200원에 샀다는 것이었다. 2천원대 가격으로 소량 판매하는 업체를 찾아야 하는 가혹한 조건이었다. 반나절 폭풍 검색 끝에 집 인근에 한 포대 2500원에 소량 판매도 하는 곳을 찾아냈다.
심상치 않았다. 목적지를 향하는 길 곳곳에 시뻘건 글씨로 ‘똥 공장은 물러가라’ ‘나의 살던 고향은 똥 냄새 산골’ 같은 펼침막이 걸려 있었다. 난감했다. 우리가 간 곳은 커다란 계분 공장이었다. 산처럼 쌓인 닭똥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명하기 힘든 매캐하고 시큼한 냄새가 숨 쉬기 편하다던 KF94 마스크 안으로 꽂혔다. 바람 방향에 따라 때때로 호흡이 곤란할 만큼 강렬했다. 차에 계분 20포대가 실리는 동안 계분이란 무엇인가, 계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계분을 써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같은 생각에 복잡했지만 그보다 더 심란했던 일은 아직 5천㎞도 타지 않은 내 새 차 트렁크에 자꾸 똥가루가 흐르는 것이었다. 아직도 그 똥가루가 종종 발견된다. 차에선 그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게 100% 리얼 암모니아 냄새, 아니 그냥 봄 냄새일까. 하여튼 다시, 봄이다.
글·사진 김완 <한겨레> 스페셜콘텐츠부 탐사기획팀 기자
*농사꾼들: 주말농장을 크게 작게 하면서 생기는 일을 들려주는 칼럼입니다. 김송은 송송책방 대표, <한겨레> 김완, 전종휘 기자가 돌아가며 매주 연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윤 대통령, 성찰 없었다…민심은 틀렸다는데 “국정 옳았다”

윤 대통령 ‘일방통행 발언’…국힘서도 “국민 그렇게 대하면 안 돼”

폭행당한 건국대 거위 ‘피눈물’…사람 좋아 다가왔을 텐데

윤 대통령 “의료 개혁” 되풀이…어떻게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 미국서 보조금 9조 땄지만…현지 반도체 승기 잡아야

‘출산 페널티’ 이렇게 크다…“경력단절 확률 14%p 차이”

다시 찾은 그 바다…“엄마 아빠는 세월호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

윤 대통령 “국정 방향 옳아”…총선 참패에도 ‘마이 웨이’

민심 경청하겠다던 윤 대통령, 또 국무회의서 자기 할 말만 했다

이준석 “윤 대통령, 재정난에도 공약 남발…선거 개입 아닌가 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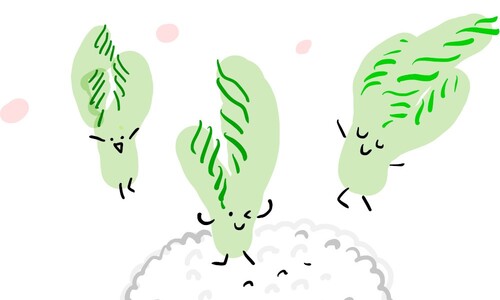
![‘제2의 청해진해운 없게’ 한발짝 겨우 딛었다[세월호 10주기] ‘제2의 청해진해운 없게’ 한발짝 겨우 딛었다[세월호 10주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13/53_17129437971656_2024041250206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