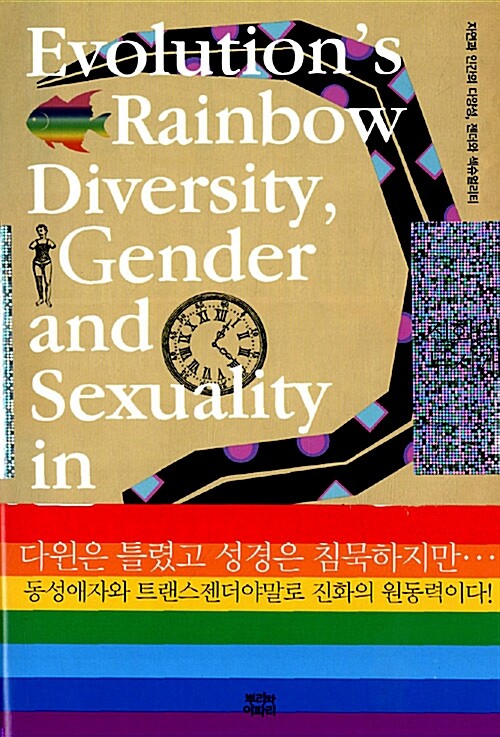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고 김기홍
책이 인생을 바꾸는지는 모르겠으나 생각을 바꾸는 건 분명하다. 프란츠 카프카가 말한 “얼어붙은 내면을 깨는 도끼” 같은 책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는 10년 전 그런 책을 만났다. 트랜스젠더 생물학자 조안 러프가든이 쓴 <진화의 무지개>(뿌리와이파리, 2010)가 그것이다. 52살에 여성으로 성전환한 조안 러프가든은 수많은 자료와 사례를 통해 다윈의 성선택 이론을 비판하고 성역할에 관한 거의 모든 고정관념을 무너뜨린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비로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비정상적인 예외가 아니라 동물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았다. 암수 성별은 고정불변이 아니며 절반 정도의 동물과 대다수 식물이 일정 시기에 수컷이면서 암컷이란 사실도 알았다. 음경이 달린 암컷 점박이하이에나, 젖샘을 가진 큰박쥐 수컷, 다섯 개의 젠더를 가진 옆줄무늬도마뱀 같은 다양한 동물이 있으며, 전세계에서 적잖은 사람이 여러 형태의 간성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알았다.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이성(二性)·이성애(異性愛)=정상’이란 고정관념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동성애, 트랜스젠더 같은 성적 다양성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됐다. 이처럼 분명한 과학적 증거가 있으니 세상도 바뀌리라 생각했다.

10년이 지났다. 그사이 <진화의 무지개>는 절판됐고, 여남(암수)이란 이분법으로 뭇 존재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잘 벼린 도끼 같은 책도 얼어붙은 세상을 깨는 데는 역부족이구나. 답답한 그 무렵 <벤 바레스>를 만났다. 조안 러프가든처럼 트랜스젠더 과학자인 벤 바레스가 암으로 세상을 뜨기 직전에 쓴 자서전에는, 과학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사랑, 과학계에 만연한 성차별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다.
43살에 남성으로 성전환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세상이 고집하는 이성애 중심주의와 남근 중심주의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하버드대학 총장 래리 서머스가 여성은 열등해서 이공계 교수가 못 된다고 했을 때, 벤 바레스는 학술지 <네이처>에 반박글을 발표해 성차별을 공론화했고 끝내 서머스의 사임을 이끌어냈다.
그는 트랜스젠더 최초로 국립과학아카데미 회원이 될 만큼 인정받는 과학자였고 더는 여성도 아니었다. 주위의 눈총을 사면서 학계 성차별에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었단 얘기다. 그러나 그는 “편견과 차별에 관한 한 우리 모두 괴물”이라며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으려 애썼다. 학회에서의 성희롱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했고, 여성을 강연자로 초청하지 않고 여성에겐 과학상도 연구지원금도 주지 않는 관행을 바꾸는 데 앞장섰다. 동료인 낸시 홉킨스가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걱정 섞인 질문을 하자 그는 말했다. “난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는 거야.”
“보편적인 무지와 혐오의 시대에 트랜스젠더로 사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으리라. 하지만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넘어 세상의 고통과 연대하는 힘을 키웠다. 그리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 “훌륭한 인간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돕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
봄꽃이 피기도 전, 이 땅에서 자신과 타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들이 잇달아 세상을 떠났다. 사람은 가고 나는 괴물이 되어간다. 잔인한 봄이다.
김이경 작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사과, 아예 못 먹을 수도…사과꽃 필 자리에 블랙사파이어·체리
![[단독]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부터 로펌 근무…“알바였다” [단독]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부터 로펌 근무…“알바였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501/53_17145552902661_20240501502698.jpg)
[단독]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부터 로펌 근무…“알바였다”

윤 대통령 거부했던 이태원특별법, 참사 1년7개월 만에 실행 눈앞

‘반전’ 컬럼비아대, 1968년부터 저항의 용광로…경찰 체포조 투입

택배 상자 타고 1000km 날아간 고양이… ‘여기 어디냥’

전교생 계좌에 100만원씩…선배가 장학금 쏘는 부산공고

채상병 특검법 진통…“2일 단독 처리” vs “충분히 논의 뒤에”

‘아홉 살 때 교통사고’ 아빠가 진 빚…자녀가 갚아야 한다, 서른 넘으면
![[사설] SM-3 요격미사일 도입 당장 멈춰야 한다 [사설] SM-3 요격미사일 도입 당장 멈춰야 한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30/53_17144698056876_20240430503543.jpg)
[사설] SM-3 요격미사일 도입 당장 멈춰야 한다

특조위 권한 줄이고, 위원장은 야당에…여야 한발씩 양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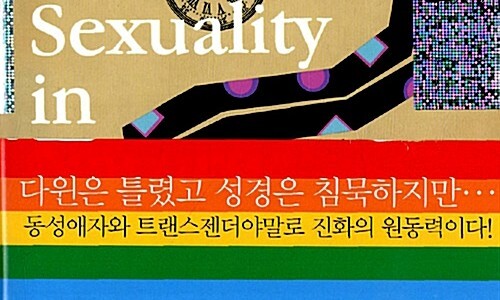







![[여자의 문장] 오늘은 남은 날들의 첫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226/53_16089104864529_3816089104598297.jpg)
![[여자의 문장] 지금 내 옆에 한 역사가 있구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205/53_16071542872292_5316071542603478.jpg)
![[여자의 문장] 긴즈버그가 살아 있다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107/53_16046788066306_4016046787948322.jpg)
![[여자의 문장] 이이효재 선생님의 사랑 덕분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016/53_16028376100073_3316028375771239.jpg)
![[여자의 문장] ‘말해야 알지’에서 ‘말하면 뭐 해’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918/53_16004060688722_7416004050542492.jpg)
![[여자의 문장] 온몸이 담덩어리였던 여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831/53_15988548501725_9015988548343815.jpg)
![[여자의 문장] 끝까지 사는 것, 내 의무이고 책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0724/53_15955930226408_18159559299991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