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한 농경지에서 20대 청년 농부가 낫으로 벼를 베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에게 취업난과 주택난에 시달리는 삭막한 도시를 떠나 시골로 오라고 손짓한다. 청년 처지에선 솔깃한 제안이다. 매년 농촌 청년을 위한 예산 보따리가 풀리기 때문이다. 2023년 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는 7995억원(38개 사업), 광역지방자치단체는 3345억원(106개 사업)을 농촌 청년 사업(귀농·귀촌 청년과 기존 청년 사업 합계)에 투입했다. 합쳐서 1조1340억원에 이른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사업을 통해 청년이 농촌에 많이 정착하면 지역 인구소멸의 대안이 되리라 기대한다. 실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청년 귀농·귀촌 추이를 보면, 연간 약 20만 명의 청년이 도시를 떠나 농촌에 이주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모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통계가 과다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귀촌 인구 집계는 대도시에 직장을 유지하며 인근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도 포함한다. 2020~2021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귀농·귀촌 수요가 단기간 급증한 영향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농촌으로 왔던 청년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역귀촌 현상도 두드러진다. 연구자들은 이 비율이 30%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청년 귀농·귀촌 정책은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즉 ‘텃세’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텃세는 청년들이 농촌에 이주해 겪는 대표적 장벽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2년 펴낸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서 농촌 청년 1209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농촌 출신 귀촌 청년은 37.5%, 도시 출신 귀촌 청년은 34.2%가 텃세를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이주 청년 지원책은 오랜 기간 터를 잡아온 지역민에게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게 농지 임대다. 박흥식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한국농어촌공사는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를 ‘농지은행’ 형태로 임차인을 모집해 일정 기간 대여한다. 임차인을 뽑을 때 청년농(만 39살까지가 청년 기준)이 최우선이다. 그럼 기존에 농사짓던 사람은 (임차 기간이 만료되고 청년농이 들어오면) 원래 농사짓던 곳을 40대 이후에는 짓지 못하게 된다”며 “이 밖에도 한정된 지자체 보조 지원 사업에서 이주 청년들을 우선시하는 문제로 기존 지역 거주 농민들의 하소연이 많다”고 말했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존에 살던 사람이 손해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가령 그 지역에 없던 편의시설을 청년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 세우는 등 전체 지역사회에 혜택이 가는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농·귀촌인의 커뮤니티 적응을 돕는 지원이 빈약한 것도 문제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막상 귀농·귀촌을 하면 실제로 부딪히는 상황이 예상과 다를 수 있다. 이주민을 돕는 협동조합 등 이주한 사람이 수월하게 커뮤니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촌사회학자인 정은정 작가도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컨설턴트가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며 “가령 최근 스마트팜 창업 권유를 많이 하는데,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 채산성을 따져야 한다. 현재의 청년 지원 정책은 이런 사업을 인큐베이팅(육성) 없이 갑자기 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농촌 지원이 대규모 유리온실 등 시설농업과 축산 등 대농에 편중된 점도 청년에게 진입장벽을 느끼게 한다. 장민기 소장은 “현재의 정책은 대농에 기회를 주려는 정책이다. 청년의 다양한 가능성을 북돋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농촌이 꼭 농업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청년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청년 이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적에만 치중하는 경향도 보인다. 정은정 작가는 “청년들은 지자체 입장에서 ‘도구화’되고 있다. 청년을 마치 학생 다루듯 하며 지자체의 홍보 수단으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귀농·귀촌 연구자는 “기초자치단체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집계해 단체장의 성과로 삼는다. 그 청년들은 사후관리되지 않는다”며 “성과로 홍보된 청년들은 몇 년 뒤 이미 떠난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이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도시 청년이 농촌에 가서 그 지역의 선전(PR)·브랜딩 역할을 맡으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운영한다. 도쿄에서 경영컨설턴트로 일하던 한 청년이 인구소멸 위기인 니가타현 도카마치시로 이주해, 지역 쌀의 직판과 브랜드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후 마을 이주자와 출생자가 늘어 이곳은 일본 내에서 ‘기적의 마을’로도 불린다.
전문가들은 주거와 교육 등 기본적 생활 문제도 귀농·귀촌 정책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장은 “농촌에 빈집이 많지만, 소유주가 잘 임대하지 않는데다 수요가 많은 읍내는 공급이 부족하다. 청년 수요에 맞는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2024년 124억원 편성) 등과 같은 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맥락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촌에서 청년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의료 분야의 대안적 설계도 필요하다. 마상진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도시 관점에서 설계된 게 많다. 학교의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우리나라 학교는) 한 반에 20명이 여러 반 있는 모델이고, 그렇지 않으면 폐교한다.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의 농촌을 보면, 학년을 섞어서 교육하는 모델도 있다. ‘농촌형’ 학교나 의료 모형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의 귀농·귀촌 문제는 지역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결됐다고 말한다. “지역의 사회보장제도, 교육, 의료 불평등 문제 해결에 천착해야 청년 귀농·귀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겁니다. 거시적 접근 없이 청년 몇 사람 정착시키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은 없을 겁니다.”(김문길 센터장)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비공개회담 85%가 윤 대통령 발언”...이 대표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태원 희생양 찾지 말자”는 전 서울청장…판사 “영상 보면 그런 말 못해”

이번에도 ‘법사위 전쟁’…이재명·박찬대 “양보 없다”

‘김건희 디올백’ 목사 스토킹 혐의…경찰 “수사 필요성 있다”

“국힘, 공동묘지의 평화 상태…뺄셈정치·군림 DNA 등 병폐”

이 “R&D 예산 복원 추경을”…윤 “내년 예산안에 반영”

유아인 편집본 ‘종말의 바보’…이럴거면 빼지 말걸 그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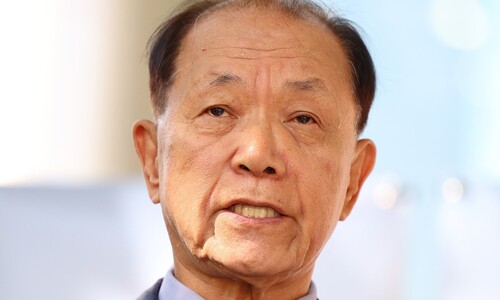
국힘 비대위원장 돌고 돌아 황우여…당내 일부 “쇄신 의문”

어도어 “이사회 개최 거부”…민희진 대표 해임안 주총 상정 ‘불발’

이스라엘과 가까운 보잉 ‘손절’…미국 학생시위에 두 손 든 대학





![“나는 민주시민인가 고객인가, 스스로 묻자”[홍세화 마지막 인터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419/53_17134545443068_20240418503834.jpg)



![‘제2의 청해진해운 없게’ 한발짝 겨우 딛었다[세월호 10주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413/53_17129437971656_20240412502062.jpg)


![[세월호 10년] 검붉은 세월](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405/53_17123267972228_20240405502090.jpg)

![[세월호 10년] ‘미완’을 딛고 한 걸음 앞으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405/53_17123260250152_2024040450399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