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동환이가 학교에서 동화책 표지를 보고 있다.
제5회 대한민국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작의 심사를 맡아 본심에 올라온 수십 편의 글과 시를 읽었다. 초등학생의 인권 감수성에 놀라고 고등학생의 생각 깊이에 감탄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 학생이 특수학급에 대해 공통으로 한 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면서 왜 특수학급을 ‘도움반’이라고 부르냐는 문제제기가 글 속에 녹아 있었다.
맞네, 맞아. 어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특수학급을 ‘도움반’ ‘사랑반’으로 부르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 친구를 사랑하고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왜 굳이 장애 학생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특수학급에만 그런 레이블링(labeling)을 부여해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것일까. 보건실도, 과학실도, 음악실도 제 명칭 그대로 부르면서 왜 특수학급만 사랑이 풀풀 솟아나고 도움이 필요하게 이름을 만들었나. 얼핏 생각하면 ‘배려’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제’가 아니었을지…. 어른들은 보지 못하던 현실을 학생들은 보고 있었다.
특수학급 호칭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장애인 출현율’이라는 개념을 먼저 짚어보려 한다. 장애인 출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은 5.4%다. 단순히 생각하면 인구 100명 중 5명은 장애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장애인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장애인 출현율은 “나 장애가 있소”라며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하면 장애인 수는 현저히 늘어난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장애인 출현율은 24.5%다. 인구 4명 중 1명은 어떤 유형이든 장애에 따른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이 낮은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낙인찍힐까 두려워 일부러 장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모두가 짐작하는 대로다. 다음으로 몰라서 못하거나 알아도 돈이 없어 장애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서 많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직된 의학적 장애 판정 체계가 장애인 출현율을 낮추는 데 큰 구실을 한다. 개인의 신체 손상 여부만 따지고 어떤 손상으로 필요한 사회적 재활 측면에선 장애라는 개념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외국의 경우 어떤 나라에선 당뇨도 장애고, 어떤 나라에선 비만도 장애다.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어떤 나라는 외국인 이민자에게도 장애인 판정을 내린다. 외국인이라고 무시해서가 아니라 외국인이 낯선 문화권인 자국에 적응해 살 때 필요한 것들을 정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각 나라의 이름을 까먹어 ‘어떤 나라’로 얼버무렸음을 고백한다.)
어랏, 외국에 살았다면 비만에 당뇨가 있는 나 역시 장애인이었네? 그것도 중복장애인. 허허 참, 나도 장애인이면서 내 아들이 발달장애인이라고 세상 끝난 듯 ‘장애도’에 갇혀 살았던 거야? 아이고, 부질없는 것에 얽매여 내 삶의 오랜 시간을 참 많이도 허비했구나.
장애 범위가 넓어지면 장애 인식도 달라진다. 비만에 당뇨가 있는 내가 이런 내 몸 상태에 적응해 살려면 하기 싫은 운동도 억지로 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돌체라테(연유가 들어가 달다)는 아주 가끔만 마시고, 석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피검사를 한 뒤 약을 왕창 받아와 꾸준히 먹는 것처럼, 아들도 자신의 발달장애에 적응해 살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재활치료를 받고 사회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의 삶을 꾸려가면 된다. 단지 그뿐이다.
이렇게 장애 범위가 넓어지면 학교 현장의 풍경도 달라진다. 학교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장애인만이 아니다. 외국에서 살다 왔거나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북한에서 건너온 학생은 물론 다양한 이유로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생이 학교에는 차고 넘친다. 반대로 영재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이 교실에 우두커니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들 학생은 모두 저마다의 어떤 상태로 인해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특수학급이 장애 학생만이 아닌 이 모든 학생을 위한 곳으로 바뀐다면 어떨까? 장애인 출현율이 장애 범위를 넓힌다면 같은 맥락으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학습장애 모두를 특수교육 범위에 포함하게 된다. 그러면 특수학급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총괄하는 사령부 기능을 할 것이다. 그때도 우리는 특수학급을 사랑반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때도 특수학급 학생은 도움이 필요한 ‘안타까운 장애인’이 될까? 이렇듯 장애 범위를 조금만 넓혀도 사랑반·도움반이라는 말 속에 있는 장애인 대상화, 타자화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과학실이 과학실이고 음악실이 음악실이듯 특수학급은 특수학급이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별도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범한 교실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장애 범위를 확대해 장애인 출현율을 높여 개인의 손상보단 사회적 재활에 무게를 두는 복지국가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특수교사가 따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특수교육이 전공필수로 채택돼, 모든 교사가 특수교사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 각 학교에 특수학급과 특수교사의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래야 특수교육이 진짜 ‘특수한 교육’이면서 동시에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이 된다.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가기로 마음먹으면 못 갈 것도 없는 길. 이제는 그 길로 가기 위해 슬슬 발을 떼도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글·사진 류승연 작가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심판받은 윤, 이제 ‘민주당 탓’ 불가능…남은 선택지 3가지

국민연금 못 받을 거라는 ‘공포 마케팅’

알레르기비염 환자 희소식…‘한약’도 건강보험 적용

딱 봐도 음주운전인데?…경찰서 찾아가 “제 폰 여기 있나요”

의협 차기 회장 “의대 증원 백지화 안 하면 협상 안 해”

타이태닉호 최고 부자의 금시계, 20억원에 팔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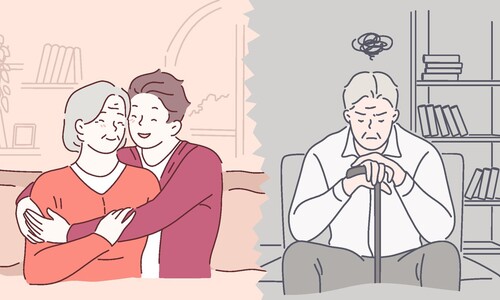
지원받을 땐 한국식, 봉양할 땐 미국식?…아들만 보면 화가 났다

‘가자전쟁 반대’ 미 대학생 체포 700명 넘어…교수 반발 확산

낮 최고 30도…내일 비 오면 더위 한풀 꺾일 듯

이스라엘-이란 ‘약속 대련’ 이후, 120만명에게 지옥문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