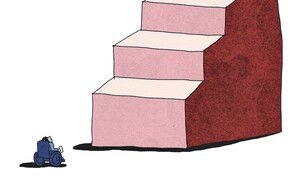일러스트레이션 슬로우어스
사건의 다른 말은 ‘남의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누군가 겪는 부당함이나 비통함에 잠시 눈을 돌리더라도, 곧 ‘세상사 순리대로 되겠지’라며 시선을 거둬들이는 타인의 일. 그러는 동안 사건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어온 세상의 순리라는 게 이런 것이었나 하고 눈을 의심한다. 믿었던 세계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사건을 겪은 사람을 만난다. 그들의 말을 기록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나에게 사건을 기록한다는 건, 인생의 많은 부분을 걸고 ‘왜’라는 물음에 답을 구하는 이들을 만나는 일이 되었다.
사건의 외곽에서 우리―라고 부르는 타인들―도 ‘왜’를 외친다. 왜 사건이 발생했나?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원인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려 한다. 그런데 사건의 당사자가 묻는 ‘왜’는 좀 다르다. 그 질문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묻는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참사라 불릴 만한 사건을 겪은 사람, 직업병 피해자가 된 사람,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물어왔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요? 때론 이렇게 묻는다. 왜 나만 살아남았죠?
나에게 묻는 말이 아니다. 내 앞에 오기까지 자신에게 숱하게 물어온 말이다. 비극 앞에 타자인 세상은 왜 이토록 많은 이가 희생됐는지를 묻지만, 살아남은 이는 다른 질문을 한다. 그 답을 구하는 일은 자책으로 돌아오기도, 설명할 수 없어 무릎이 꺾이는 일이기도, 사건의 원인을 짚으려는 애씀이 되기도 한다. 어떤 형태건, 답을 구해야 살아갈 수 있다. 그 끝에 어떠한 답을 찾은 이는 나 같은 사람에게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가 기록하는 순간이다.
인생에 들이닥친 사건을 설명하고 해석할 ‘말’을 들고 온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먹먹한 존경을 품는다. 내게 그들은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온 이들이었다. 오롯이 자신이 더듬어 찾아야 하는 출구 같은 언어였기에, 나는 종종 어두운 골목을 떠올렸다.
그러다 한 드라마에서 골목을 보았다. 과거로 회귀한 딸이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를 만나는 내용이었는데(<어쩌다 마주친, 그대>, KBS2), 어느 날 아버지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형을 찾는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 당한다. 피투성이가 되어 다리를 절뚝이며 어두운 골목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를 기다리는 건, 회귀해 그와 같은 고등학생이 된 딸. 괜찮냐는 질문에 아버지는 말한다. “괜찮아.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 네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반문에 그는 이런 말을 한다.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안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폭력에 던져졌다.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함 앞에 그는 자신을 납득시킬 답을 찾아야 했다.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버틴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을 골목에 방치하는 것 뿐이다. 딸은 미래 아버지의 다리에 장애가 생긴 것이 이때라는 걸 직감한다. 그리고 손을 내민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렇게 내버려뒀겠지. 이 골목에 너 혼자였을 땐.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두지 않아.”
두 사람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보며, 나는 ‘왜 내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 사이로 불쑥 들어오는 손을 생각한다. 어두운 골목에서 무릎 꺾이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의 답을 찾아 세상에 나온 이들이 있다. 그 골목에서 “너를 혼자 두지 않아”라며 손을 내미는 이들이 있다. 4월이면 떠올리게 되는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빈다.
희정 기록노동자·<베테랑의 몸> 저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파괴왕’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파괴한 10가지 [논썰] ‘파괴왕’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파괴한 10가지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503/53_17147369961991_20240503502443.jpg)
‘파괴왕’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파괴한 10가지 [논썰]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조사…‘VIP 격노’ 기자 질문엔 침묵
![[단독] 이종섭 앞에서 막힌 ‘임성근 조사’…직권남용죄 가능성 [단독] 이종섭 앞에서 막힌 ‘임성근 조사’…직권남용죄 가능성](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503/53_17147364734906_20240503502462.jpg)
[단독] 이종섭 앞에서 막힌 ‘임성근 조사’…직권남용죄 가능성

의대 교수들 “정부, 증원 확정하면 1주일 집단 휴진”

죽음 두려워 않고 “내 목을 베라”…녹두장군 호통이 열도에 퍼졌다
![이재용 회장의 짝짝이 젓가락 [아침햇발] 이재용 회장의 짝짝이 젓가락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503/53_17146937716454_20240502504102.jpg)
이재용 회장의 짝짝이 젓가락 [아침햇발]

일본, 극장 결승골로 U-23 아시안컵 우승…파리 간다

윤,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기초연금 40만원”

윤 대통령, 10번째 거부권 태세…이재명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

‘아들’ 전화 받고 돈 보내려던 산후도우미…아기 아빠가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