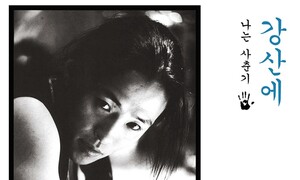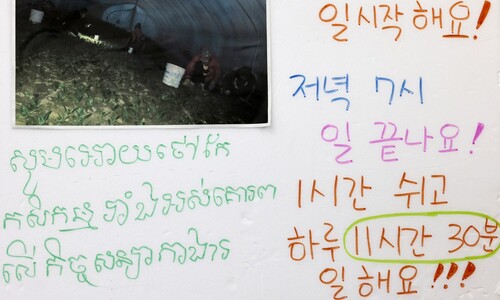9와 숫자들 《유예》 앨범 재킷.
친구 차에 짐을 싣고 서울을 떠나던 때를 기억한다.
웬만한 세간살이는 내다 버려야 했다. 대학을 마치고 취직할 때까지 큰아버지 독서실 일을 도우며 생활하기로 했다. 독서실 계단을 올랐다. 책상들이 놓인 방 한 칸을 거처로 삼았다. 한쪽 책상에 책들을 꽂아두고 비키니장에 옷가지를 걸었다. 베란다에 샤워부스가 놓이기 전에는 근처 헬스장에 가 몸을 씻고 학교에 갔다.
한번은 고무대야를 주워 베란다에 뒀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컸다. 대야에 따듯한 물을 담아 반신욕 하며 꿈을 다졌다. 말하자면 나는 ‘수석 총무’였다. 함께 일할 총무를 구하거나 가끔 일할 사람이 없을 때 자리를 지켰다. 몇몇 총무는 집을 나와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다. 삼수하던 친구는 집에 있는 게 눈치가 보여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강원도 친구는 집 구할 돈이 없어서, 나와 같이 방을 썼다.
모두 그곳을 떠나려 애썼다. 따지고 보면 나는 돌아온 셈이었다. 경기도 광명 사거리 쪽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북 익산으로 이사했기 때문이다. 익산에서 안양, 수원, 서울을 거쳐 다시 광명에 온 것이다.
독서실에서 언덕을 넘어 조금 더 가면 내가 살던 동네가 나온다. 광명시장 방향으로 돌계단이 길게 이어진 곳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다고 그 집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뒤 방 두 칸짜리 빌라로 이사했다. 한 칸은 하숙을 놓았다. 분명 누가 살았을 텐데 기억나지 않는다. 어머니가 내일이면 네 방이 생긴다고 속삭였던 때만 또렷하다.
그 시절 부모님이 도시살이에 안간힘을 다하는 동안 나는 이웃들 손에 자랐다.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다. 여느 때와 같이 골목에서 놀다가 친구 따라 친구 집에 갔다. 아무렇게 신발을 내팽개치고 거실에 들어서니 러닝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는 놀라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남의 집을 제집 드나들듯 하면 안 된다고 크게 혼났다. 여름에는 집집이 현관문을 열고 지냈다. 살림이 훤히 보였다.
단짝 친구가 살던 주택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원룸 건물이 들어섰다. 전학 가서도 종종 그 아이를 그리워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곧장 어느 작은 출판사에 들어갔다. 도망치듯 독서실을 떠났다. 계속해서 도시와 도시를 옮겨 다녔다. ‘9와 숫자들’의 미니앨범 《유예》를 들을 때면 지나온 도시들과 지나간 사람들이 떠오른다. “작은 조약돌이 되고 말았네” 하고 시작하는 표제작 <유예>가 마음 한구석을 쿡쿡 찌른다.
“유예”된 꿈과 “연체”된 마음.
바위처럼 크고 단단해서 더는 떠돌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특히 좋아한 곡은 <그대만 보였네>다. “비가 와도 내겐 우산이 없어/ 흠뻑 젖은 채로 혼자 걷던 어느 날엔가” 하는 가사가 꼭 나와 같다고 생각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가물가물하지만 오래전 어느 육교에서 한 친구와 언성을 높이며 싸운 때가 있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관계에서 달아났다.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굴었다.
내가 되려던 것은 뭐였을까.
어느새 짐이 늘었다. 비가 내리고 꽃잎이 날린다.
최지인 시인
*너의 노래, 나의 자랑: 시를 통해 노래에 대한 사랑을 피력해온 <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 최지인 시인의 노래 이야기. 3주마다 연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주가조작 수사’ 할 만큼 했다는 윤…검찰 쪽 “김건희 불러도 안 나와”

우크라 드론 ‘1500㎞ 비행’ 러시아 본토 최대 석유화학 단지 타격

20km 걸어서, 41일 만에 집에 온 진돗개 ‘손홍민’

“피의자 이종섭 왜 호주대사로 임명했나?”라고 윤에게 묻자…

민주 초선 당선자 60여명 ‘채상병 특검 관철’ 천막농성 돌입

“윤 대통령의 유일한 결단, 연금개혁 미루자는 것”

전직 경찰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영화 같은 탈주…보이스피싱 대명사
![윤 긍정평가 24%…90년 이후 대통령 취임 2년 무렵 중 최저 [갤럽] 윤 긍정평가 24%…90년 이후 대통령 취임 2년 무렵 중 최저 [갤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510/53_17153124260464_20240510501199.jpg)
윤 긍정평가 24%…90년 이후 대통령 취임 2년 무렵 중 최저 [갤럽]

개식용 관련 업소 전국 5625곳…8월까지 전·폐업 계획서 내해야

“기후위기서 구해주세요” 남·북극 연구자가 직접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