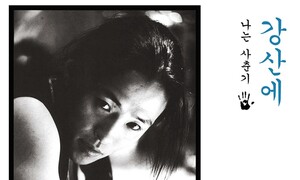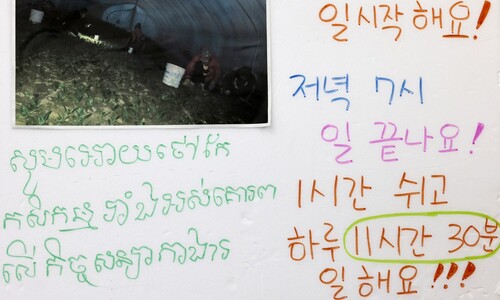강아솔 《정직한 마음》 앨범 재킷.
어린 나는 엄마 손잡고 커피숍에 따라갔다.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던 기억. 그 남자 얼굴은 이제 없고 어머니는 멍든 눈을 가리려고 진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사표를 내고 이십여 년을 집안일에 전념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상사를 만나러 간 사연과 마음이 어떠했는지 가늠할 길은 없지만 요새 들어 젊은 부부가 감당했을 지난 시절이 눈에 밟힌다. 명절이나 생신 때 뵙는 나이 든 부모님 모습이 괜히 낯설어서일까. 핏덩이 때 데려온 개들이 늙어 짖지 않은 지 오래다.
옛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중에 일어난 일이다. 일꾼들이 낡은 더플백을 버리는 것인 줄 알고 드럼통에 넣고 불을 피웠다. 할머니 할아버지 젊을 적 사진과 자식들 사진이 들었다고 했다. 그것들이 몽땅 타버렸다. 할머니는 성미가 급한 아버지를 불편해했더랬다. 부모에게 대들며 험한 말을 쏟아내던 십 대 소년이 그려졌다. 어머니는 육아일지에 돼지꿈을 꿨다고 적었다.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적혀 있다. 나는 30일 만에 첫 미소를 지었고 백일에는 딸랑이를 쥐여주면 잘 놀았다고 한다.
환갑을 앞둔 어머니는 내가 옛날이야기를 하면 그런 걸 다 기억하느냐고 손사래를 친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을 오래 기억하는 내 성정 탓에 억울한 속도 있을 것이다. 인생의 낙이 없다는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적은 것은 죄다 슬픈 것뿐이었다.
책방에서 이웃들과 최승자가 서른 살에 내놓은 시집 <이 시대의 사랑>을 소리 내어 읽고 있다. 한 분이 자기에게 1970년대는 무서운 시절이었고 1980년대는 부끄러운 시절이었다고 했다. 1990년대는 어떤 시절이었을까. 어머니가 나를 낳고 아버지가 스물일곱 살이었던, 반지하 단칸방에서 그들은 1980년대의 끝과 1990년대의 시작을 두고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 그 소원이 나였을까. 내가 아니었으면 어쩌나. 나는 무어 때문에 아파했나.
강아솔의 두 번째 정규앨범 《정직한 마음》은 담담한 시선으로 지난 시간을 더듬는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그는 눈 덮인 사라오름으로 듣는 이를 이끌고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로,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엄마>) 하고 고백하는 목소리로 우리가 잊고 있던 기억을 불러들인다. “그대여 난 항상 여기 있을게” “언제든 내게 달려와도 좋아”(<언제든 내게>) 노래하는 그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음악의 힘을 믿게 한다.
<남겨진 사람들>에는 두 어르신의 대화가 담겨 있다. “자네 주위엔 이제 몇 명 남았는가” 하는 질문에 어르신은 “이제 나까지 일곱 남았네”라며 “이제 수를 세는 데 열 손가락도 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남은 자가 오래도록 되새기고 겪어야 할 뜻밖의 일 같다. 강아솔은 떠난 것과 남은 것을 헤아리며 “나보다 강한 마음으로 날 지켜봐줬던 너를 생각하며”(<매일의 고백>) ‘정직한 마음’으로 노래한다.
인생이 참 길다고 하는 네게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하는 네게 해묵은 이야기를 늘어놓은 건, 삶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가리라는 예감 때문이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 어떤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될까. 부끄러움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거라며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될까. 해변에 누워 책을 읽다 잠들었던 지난여름을 돌이키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될까.
최지인 시인
*너의 노래, 나의 자랑: 시를 통해 노래에 대한 사랑을 피력해온 <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 최지인 시인의 노래 이야기. 3주마다 연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주가조작 수사’ 할 만큼 했다는 윤…검찰 쪽 “김건희 불러도 안 나와”

우크라 드론 ‘1500㎞ 비행’ 러시아 본토 최대 석유화학 단지 타격

20km 걸어서, 41일 만에 집에 온 진돗개 ‘손홍민’

“피의자 이종섭 왜 호주대사로 임명했나?”라고 윤에게 묻자…

민주 초선 당선자 60여명 ‘채상병 특검 관철’ 천막농성 돌입

“윤 대통령의 유일한 결단, 연금개혁 미루자는 것”

전직 경찰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영화 같은 탈주…보이스피싱 대명사
![윤 긍정평가 24%…90년 이후 대통령 취임 2년 무렵 중 최저 [갤럽] 윤 긍정평가 24%…90년 이후 대통령 취임 2년 무렵 중 최저 [갤럽]](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510/53_17153124260464_20240510501199.jpg)
윤 긍정평가 24%…90년 이후 대통령 취임 2년 무렵 중 최저 [갤럽]

개식용 관련 업소 전국 5625곳…8월까지 전·폐업 계획서 내해야

“기후위기서 구해주세요” 남·북극 연구자가 직접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