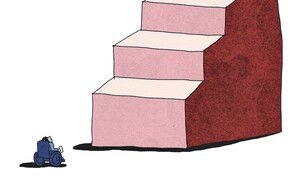일러스트레이션 슬로우어스
난생처음 큰 수술을 겪은 뒤로 아픈 사람들이 쓴 글을 닥치는 대로 찾아 읽었다. 예측을 벗어나는 몸을 지닌 채 살아온 선배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싶었다. 몸의 문제는 현대 의학에 의존하는 게 최선이라고 믿어왔지만, 의사의 예측이 빗나가고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자 나는 초조해졌다. 두통약은 반알이면 되는, 심지어 파마약마저 잘 듣던 내 몸이었다. 그동안 조용히 나를 보필하던 내 몸뚱이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갑자기 제멋대로 구는 몸을, 그렇게 낯선 몸 앞에서 절박해지는 마음을 돌보는 법을 찾아야 했다.
‘트릭스터(trickster) 몸’. 페미니스트 과학기술학자 임소연은 수술 과정에서 통감한 ‘몸의 활성과 저항’을 표현하기 위해 도나 해러웨이의 개념을 끌어온다. 트릭스터는 본래 사기꾼을 뜻하지만, 이들은 이 용어를 통해 우리가 속임당할 것을 알고도 공생을 모색해야 하는, 그렇기에 완전한 지배를 포기한 채 신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존재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질병을 겪는다는 것은 트릭스터 몸, 즉 통제할 수 없는 몸에 맞닥뜨리는 경험이다. 낯설지만 마냥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는, 의심스럽고 때로 밉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나의 몸.
아픈 몸은 극복이 아니라 협상을 요한다. 의학은 낯선 몸과 협상할 때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의료 전문가들의 지시대로 검사와 수술을 받고 몸의 상처를 관리하고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한다. 믿을 만한 의학 정보를 찾아 읽다보면 내 몸을 비로소 알 것도 같다. 그러나 의학은 딱 거기까지다. 의학이 멈춘 곳에서 나는 내 몸에 관한 관찰과 실험을 시작한다. 새로운 약이 잘 맞는지 내 몸의 반응을 살핀다. 무엇을 먹어야 속이 편안한지, 어떻게 움직여야 상처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쉬어야 내 몸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내 몸의 눈치를 보며 일상을 꾸린다. 무엇보다 이 모든 지식과 기술과 노력에 내 몸이 화답하지 않을 때, 배신감이나 무력감에 굴복하기보다는 변덕스러운 몸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몸의 저자’가 돼야 한다.
진단 이전으로, 수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다. 큰 고민 없이 먹고 마구 일하고 계산 없이 움직이던 때로, 내 몸을 철석같이 믿던 때로. 그렇지만 건강이 최고라는 말, 빨리 나으라는 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의구심을 품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기도 하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의 저자 조한진희는 건강을 맹렬히 추구해야 하는 선으로, 질병을 없애야 할 악으로 규정하는 우리 사회의 건강중심주의를 비판하며, 건강할 권리를 넘어 ‘잘 아플 권리’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질병은 그 자체로 비극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겪어낼 수 없을 때 비극이 된다. <난치의 상상력>을 쓴 안희제는 질병이 단지 불행이나 치료 대상이 아니라 삶의 조건이자 세상을 고민하는 하나의 방식임을 강조한다. 성가신 몸과 살아가면서 사회의 기준보다는 몸의 요구에 맞춰 사는 법을,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껴안는 법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병이 삶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일상의 조건이 될 때, 아프거나 약한 몸도 잘 지낼 수 있는 사회일 때, 아픈 사람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자기 몸을 혹사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도 취약한 몸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몸의 저자들과 함께 불완전한 몸, 불확실한 지식과 기술, 불안정한 일상을 조금 더 잘 겪어내는 법을 고민해본다.
장하원 과학기술학 연구자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파괴왕’ 윤석열 2년의 징비록 [아침햇발] ‘파괴왕’ 윤석열 2년의 징비록 [아침햇발]](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28/53_17142976321088_20240428501372.jpg)
‘파괴왕’ 윤석열 2년의 징비록 [아침햇발]

내년도 의대 정원 1500명 늘어날 듯…사립대들 증원 폭 유지

“다 듣겠다”는 대통령실…민주 “듣는 자리 아니라 답하는 자리”

참패 3주째 ‘무기력’…국힘 안에서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인천서 철근 빼먹은 GS 자이, 서초서는 중국산 가짜 KS 유리 사용

민희진에게 ‘업무상 배임죄’ 적용할 수 있나

“채 상병 수사기록 혐의자 다 빼라” 유재은, 이르면 29일 공수처 재소환

국민이 심판한 윤, 이제 ‘민주당 탓’ 못 해…남은 선택 3가지

한강에서 열리는 ‘수면 콘서트’…침대에 누워 잠들면 됩니다

임실 옥정호에서 60대 주검 발견…경찰, 신원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