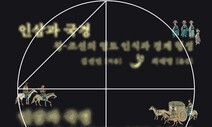<한글과 타자기> 김태호 지음, 역사비평사 펴냄
우리는 종종 과학기술의 역사를 일방적인 수용과 전파의 과정으로만 생각한다. 동서고금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론이나 발명품을 상정하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세계에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 위에 설 때 ‘한국’ 과학기술사란 서구보다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조상의 우수함을 추켜세우거나, 그런 금속활자를 갖고도 종교개혁은커녕 인쇄혁명조차 일어나지 못했던 열등함을 원망하는 두 극단을 오가기에 십상이다.
김태호의 <한글과 타자기>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국뽕’과 ‘미개’ 담론을 벗어나, 타자기라는 프리즘으로 완전히 새로운 ‘한국’ 과학기술사를 상상해보자고 제안한다. 타자기는 어떤 문자든 찍어낼 수 있는 만능이 아닌, 어디까지나 서구 로마자를 ‘기본’으로 상정한 기계다. 로마자와 완전히 다른 문자, 가령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과 일본에서 타자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도 어찌어찌 타자기를 개발했지만, 이때의 타자기란 서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계였다.
그럼 로마자와 비슷한 표음문자인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은 이웃한 두 나라보다 사정이 나았을까?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중국과 일본 못지않게 언어생활에서 한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데다, 서구와 달리 세로쓰기가 훨씬 익숙했던 탓이다. 무엇보다 하나의 자모음이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는 로마자와 달리, 한글은 여러 개 자모음이 모여 하나의 음절글자를 이룬다. 흔히 한글의 ‘과학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거론되는 모아쓰기야말로 한글의 기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따라서 한글의 기계화는 한글 고유의 특성을 새롭게 정의하거나 구성해, 로마자를 바탕으로 한 타자기와 조화시키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이 어려운 과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한국 최초의 개인 안과병원인 ‘공안과’의 원장 공병우였다. 그가 개발한 타자기는 속도와 효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역시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던 군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가장 강력하고 조직화된 집단이었던 군의 지원을 등에 업고 ‘공병우 타자기’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타자기 ‘생태계’랄 것을 만들어냈다.
다만 ‘공병우 타자기’는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다. 세벌식 타자기가 찍어낸 들쭉날쭉한 글꼴이 모아쓰는 글자라는 한글 고유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았던 탓이다. 물론 공병우는 세벌식이야말로 초성-중성-종성으로 이루어진 한글과 가장 잘 어울리는 구조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1969년 박정희 정부가 두벌식을 기본으로 한 네벌식 자판을 표준으로 제정하며 타자기 시장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이후 공병우는 한글운동을 매개로 민주화운동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했고, 세벌식 타자기는 더 ‘한글다웠으나’ 군사정권이 부당하게 탄압한 희생물이라는 서사를 얻었다. 여기에 더해 1980년대 이후 고딕이나 명조 등 일본식 네모반듯한 글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며, ‘공병우 타자기’의 탈네모틀 글꼴은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오래된 미래’로 각광을 받았다.
그렇게 세벌식 타자기의 탈네모틀 글꼴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문에서 1990년대 대학 학생운동 자료집, 2005년 <한겨레>의 ‘한결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하나의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 또 사회가 기술을 새로이 해석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이야말로 지은이가 생각하는 ‘한국’ 과학기술사일 터다.
유찬근 대학원생
*역사책 달리기: 달리기가 취미인 대학원생의 역사책 리뷰. 3주마다 연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비공개회담 85%가 윤 대통령 발언”...이 대표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태원 희생양 찾지 말자”는 전 서울청장…판사 “영상 보면 그런 말 못해”

이번에도 ‘법사위 전쟁’…이재명·박찬대 “양보 없다”

‘김건희 디올백’ 목사 스토킹 혐의…경찰 “수사 필요성 있다”

“국힘, 공동묘지의 평화 상태…뺄셈정치·군림 DNA 등 병폐”

이 “R&D 예산 복원 추경을”…윤 “내년 예산안에 반영”

유아인 편집본 ‘종말의 바보’…이럴거면 빼지 말걸 그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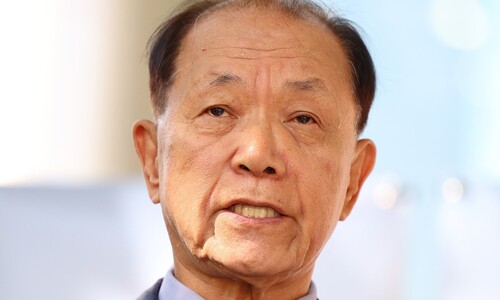
국힘 비대위원장 돌고 돌아 황우여…당내 일부 “쇄신 의문”

어도어 “이사회 개최 거부”…민희진 대표 해임안 주총 상정 ‘불발’

이스라엘과 가까운 보잉 ‘손절’…미국 학생시위에 두 손 든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