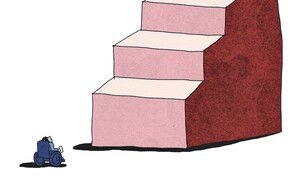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책을 만든다고 하면 주변에서 “남이 쓴 원고 보는 거 힘들지 않냐?”는 말을 자주 한다. 자기가 쓰지도 않은 원고에 정이 가느냐.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도 있을 텐데 괜찮냐. 저자에게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직접 다듬어주는 일이 짜증 나지 않느냐. 이런 뜻이다.
이제는 바로 답할 수 있는데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다.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 지칠 때는 있었지만, ‘내 글이 아닌 남의 글’이어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흉내 내는 재미가 더 컸다. 문과 출신 에디터가 수학자도 돼보고, 40대가 20대의 고민도 해보고, 여성이 남성 입장도 돼보고, 일개 사원이 사장처럼 말해보는, 그런 ‘빙의’의 재미가 항상 남달랐다.
‘빙의’의 고통도 있다. 사실 저자 원고를 다듬기보다 더 힘든 건, 독자에게 책을 설명하는 말을 찾을 때다. 원고지 1천 장 넘어가는 글을 교정보는 일보다, 고작 두세 장밖에 안 되는 책소개 글을 쓰는 일이 항상 더 어렵다. 보도자료나 표지 문안을 쓰는 일은 원고를 고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과연 이 책이 필요한 사람들의 말과 닮았나?’라는 질문은 에디터의 숙명이다.
그래서 책 만드는 에디터들은 다른 에디터가 만든 책을 집어 들면, 본문 내용보다 표지 문안이나 차례를 먼저 본다. 그거야말로 독자의 말로 이 책을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책 잘 만드는 선수일수록 책이 잘 안 팔리면 ‘원고가 별로였다’고 하지 않고, ‘내가 책을 못 만들었다’고 말한다. 독자의 말을 못 찾았다는 자책이 앞서는 것이다. 그런 선수들에게 ‘당신이 독자와 똑같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냐’고 말해봐야 위로가 안 된다. 에디터란 직업은 결국 커뮤니케이터이고, 커뮤니케이터의 본령은 내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말을 찾아내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좀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의 원고를 하나의 책으로 만든다는 건 결국 이 책을 살 사람의 말을 찾아내고 그것을 흉내 내는 과정이다. 독자의 말로 책의 메시지를 잘 설명해내는 것, 사실 이게 책 만드는 일의 전부다.
책 만드는 일만 그런가. 세상의 많은 일이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이다.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해야 물건이 팔리고, 광고가 붙고, 기사가 공유되고, 표를 얻는다. 마셜 매클루언은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상대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다. ‘사용한다’는 말을 ‘흉내 낸다’ ‘훔친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상대의 말로 표현되지 못하면 마음을 파고들지 못하고, 새로운 대안이 없을 때라면 상대의 말을 반복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소통한다고 느낀다.
최근 보수 정당에 젊은 당대표 바람이 분다. 이 바람의 성공 요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핵심은 이것이다. 그가 젊어서 남성이어서 보수여서 성공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지지받아야 할 대중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들의 언어로 놀며 그들에게 직접 마이크를 줬기 때문에 성공했다. 자기 언어를 대중에게 주입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를 훔쳐와서 써먹는 걸 터득했다.
옳은 정치여도 대중의 말이 아닌 자기 말을 고집하는 정치와 나쁜 정치여도 대중의 말을 훔쳐와 쓸 줄 아는 정치를 보며, 전자의 손을 선뜻 들어주기 힘들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근원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정치가 과연 ‘옳을’ 수 있을까? 책 만드는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은 ‘좋은 책인데 독자가 안 알아준다’고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다. 좋은 책인데, 좋은 기사인데, 좋은 정치인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건,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본령을 거스르는 일에 불과하다. 좋은 에디터는 항상 상대의 말을 찾아내지 못해 속상할 뿐이다.
김보경 출판인
*이번호로 ‘김보경의 노 땡큐!’를 마칩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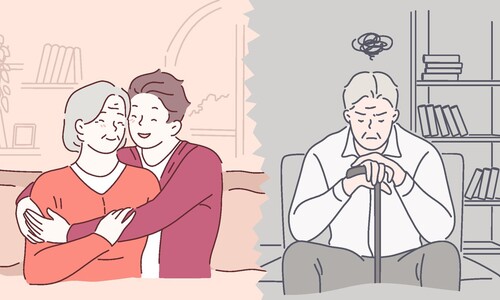
지원받을 땐 한국식, 봉양할 땐 미국식?…아들만 보면 화가 났다

의협 “의대 교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똘똘 뭉쳐 싸울 것”

녹색정의당, 다시 정의당·녹색당으로…“뼈아픈 총선 결과 성찰”

어른들 싸움 속에도…뉴진스 신곡 ‘버블검’ 뮤비 반일 만에 ‘500만 돌파’
![해병대 수사외압 타임라인 총정리…특검이 밝혀야 할 ‘격노의 배경’ [논썰] 해병대 수사외압 타임라인 총정리…특검이 밝혀야 할 ‘격노의 배경’ [논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26/53_17141316049754_20240426502385.jpg)
해병대 수사외압 타임라인 총정리…특검이 밝혀야 할 ‘격노의 배경’ [논썰]

‘굴착비용도 부풀려’…김건희 여사 오빠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 증언

경찰, 군 유가족 10명 검찰 송치…“검사 출신 김용원에 부화뇌동”

이천수 “정몽규 무조건 사퇴하라” 작심 발언
![[단독]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불송치 뒤집힐까…경찰, 다시 검토 [단독]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불송치 뒤집힐까…경찰, 다시 검토](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4/0426/53_17140981717962_20240426500969.jpg)
[단독]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불송치 뒤집힐까…경찰, 다시 검토

“참사 때마다 빨갱이 딱지 붙이는 거, 4·3이 시작이더라”